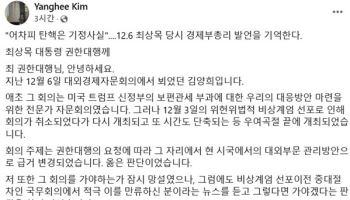단순히 유동성이 말라붙고, 시장 분위기가 위축됐기 때문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평가다. 최근 들어 대형 매물 인수에 대한 리스크가 어느 때보다 커졌다는 점이 최근 시장 전체에 퍼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수조원대 매물을 들고 있는 매각 측에서도 돌아가는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
17일 자본시장에 따르면 올 들어 바이아웃(경영권 인수)이 이뤄진 2조원 이상 M&A 매물로는 오스템임플란트(048260)(2조2779억원)와 SK쉴더스(약 2조원) 등을 꼽을 수 있다. 1조원 대로 범위를 넓히면 에스엠(041510)(1조2500억원)과 루트로닉(085370)(1조원), PI첨단소재(178920)(1조원) 등이 있다.
상반기에는 오스템임플란트와 에스엠 인수 때 적용한 공개매수 붐이 강하게 일었다. 일반주주에게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해주겠다는 시도가 신선하게 받아들여지면서 이목을 집중시켰다. 때마침 에스엠 인수전 때 불붙었던 하이브(352820)와 카카오(035720) 간 공개매수 경쟁도 이슈 몰이를 톡톡히 했다.
당시만 해도 ‘올해 M&A 시장은 뭔가 다르겠구나’는 예상이 적잖았다. 전에 없던 분위기 조성이 그런 예상을 증명하는 듯 했다. 그런데 하반기 들어서는 상반기와 같은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를 두고는 의문 부호가 여기저기서 찍히고 있다.
이달 매각 작업을 본격화할 예정인 국내 최대 해운업체인 HMM은 정확한 매각가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최소 4조원에서 최대주주가 보유한 영구채까지 얹을 경우 1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매물에 대한 가격 범위가 4조~10조원에 달한다는 것은 매각 방향성이 그만큼 잡히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최대한 싸게 사려는 원매자와 프리미엄은 얹어야 하는 매각 측의 괴리감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2조원대 매물로 꼽히는 국내 1위 의약품 도매업체 지오영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블랙스톤이 2019년 인수 이후 매각 작업에 서서히 시동을 거는 모습이지만, 분위기가 생각보다 뜨겁지는 않다. 모두가 2조원이란 인수가격을 감당할 원매자를 찾는 것이 성패의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
수조원을 호가하는 초대형 매물에 대한 부담감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요즘도 그렇고 모두가 큰 가격 베팅에 주저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한번에 수조원을 투자하는 것에 유독 부담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특히 2조원을 하나의 기준선으로, 이 가격을 넘어갈 때는 단독 바이아웃 자체를 망설인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요즘 라지캡 바이아웃을 하려면 크게 세 가지 중 하나에 부합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관계자는 “인수와 즉시 시장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는 글로벌 대기업이나 해당 포트폴리오에 확신을 하는 초대형 PEF 운용사, 아니면 컨소시엄밖에는 답이 없다”며 “이를 잘 아는 매각 측도 해외 쪽에 계속해서 태핑을 넣는 게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PEF 운용사 입장에서 결국 다시 팔아야 한다는 전제를 생각했을 때 가격 부담이 인수 검토 단계부터 적용된다는 말도 있다.
초대형 바이아웃에 대한 인기가 시들해진 사이 PEF 운용사들은 에쿼티(지분)나 메자닌 투자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초대형 운용사들은 지분 투자에만 수천억원 투자를 감행하기도 한다. PEF 운용사라고 바이아웃만 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에쿼티 투자가 대세가 되어가는 ‘로우 리스크 전성시대’로 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PEF 업계 관계자는 “투자처를 여러 곳으로 펼쳐서 전체 펀드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겠다는 복안”이라며 “수조원대 매물에 투자할 여력이 있더라도 한 곳에 올인하는 전략을 펼치는 운용사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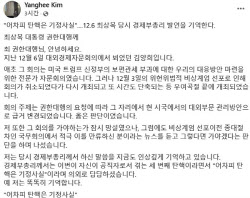





![[포토]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투표하는 우원식 국회의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700978t.jpg)
![[포토] 달러 상승 이어져...](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700871t.jpg)
![[포토] 헌법재판소 소심판정](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700760t.jpg)
![[포토] 정청래 단장과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700742t.jpg)
![[포토] 윤석열 법률대리인 헌재 출석](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700731t.jpg)
![[포토]내수경기활성화 민당정협의회 열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700609t.jpg)
![[포토]입장하는 이재명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700546t.jpg)
![[포토] 달려라~](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700515t.jpg)
![[포토]이재명 "한덕수·국민의힘 내란 비호세력 탄핵 방해로 민생 경제 추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700363t.jpg)
![[포토]윤이나,후배 양성을 위해 2억원 기부했어요](https://spn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2/PS24122600088h.jpg)
![45년간 자리 지킨 ‘포프모빌’…전기차로 바뀌었다는데[누구차]](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2/PS24122800166h.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