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전기차를 몰고 있는 강영일(38, 가명) 씨는 충전을 할 때마다 눈살이 찌푸려지기 일쑤다. 거미줄이 쳐져있는 것은 다반사고, 새둥지나 벌집을 본 경험도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거미줄 없는 충전기를 찾는 것이 힘들 정도로 충전소 관리 상태가 엉망”이라면서 “충전할 때 쓰려고 승용차에 항상 고무장갑을 구비해놓고 있다”며 웃었다.
|
보조금 챙기고 사후관리 ‘나몰라라’ 얌체 사업자들
10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등록된 전기차는 54만3900대(2023년 12월말 기준)로 집계됐다. 전기차 충전기 보급 대수는 30만5309기로, 충전기 1기당 전기차 대수(차충비)는 1.9대였다. 차충비는 전체 전기차 대수를 충전기 개수로 나눈 수치로, 낮을수록 충전 부담이 적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의 차충비는 유럽(13대), 세계 평균(10대), 중국(8대) 등 주요 전기차 선진국을 크게 앞선다.
그나마 협회가 점검한 곳들은 이용 빈도가 높아 수익이 나는 충전기들로, 자동차환경협회 등에서 관리해온 곳이다. 업계에선 전국에 설치된 충전기 절반 이상은 낮은 이용률로 수익이 나지 않아 방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부 사업자들이 정부 보조금을 챙기려고 수요와 상관없이 엉뚱한 곳에 설치한 충전기들이다. 수도권을 벗어나면 쓰레기가 쌓이고 녹슬어 ‘흉물’이 된 충전소가 수두룩하다. 강승범 한국산업연합포럼 수석연구원은 “기본적인 수요 조사조차 없이 설치된 충전기가 부지기수”라면서 “수익이 나오지 않아 파산하거나, 사후 관리는 뒷전이다”고 말했다.
|
전문가들은 대기업의 전기차 충전사업 진출이 이같은 시장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고, 변화를 촉진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이제 양적 팽창보다 질적 성장을 추구할 때”라면서 “자본력, 기술력, 브랜드파워를 갖춘 대기업들로 인해 충전시장이 보다 활성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기차 충전기시장은 크게 제조와 설치·운영으로 나뉘어진다. 양대 시장 모두 초기에는 벤처·스타트업 등 중소기업 위주였지만, 최근에는 대기업들이 세(勢)를 키우고 있다. 성장 잠재력을 눈여겨 본 SK, LG, 현대차, 롯데, 한화, GS, LS 등이 최근 2년새 앞다퉈 진출했다. 시장조사기관들은 지난해 550억 달러(약 73조원)였던 글로벌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장이 2030년 3250억 달러(약 434조원) 규모로 약 6배 성장하고, 같은 기간 국내 시장은 9000억원에서 6조3000억원 규모로 7배 커질 것으로 예측했다.
대기업 위주로 재편되는 시장…퇴로 고민하는 中企들
한켠에서는 시장을 개척했던 강소기업들이 대기업의 자본력 등에 밀려 강제 퇴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한다면 버티기 쉽지 않다”며 “자연스럽게 엑시트(투자금 회수)를 고민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업계 노하우를 터득한 대기업들이 인수·합병(M&A)보다 자체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 투자 유치가 힘들어졌다는 현실적 고민도 있다.
서울의 한 대학 교수는 “앞으로 충전기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설 땅이 점차 좁아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보조금 수령이 목적인 ‘먹튀기업’ 뿐 아니라, 기술력을 갖춘 강소기업마저 대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밀려 생존을 위협받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대-중소기업의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등 정책적 수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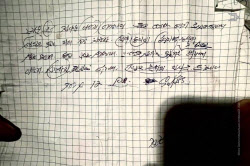




![[포토]크리스마스엔 스케이트](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500245t.jpg)
![[포토]37번째 거리 성탄예배 열려 방한복·도시락으로 사랑 나눔](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500231t.jpg)
![[포토]조국혁신당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500219t.jpg)
![[포토]우리 이웃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500173t.jpg)
![[포토]메리크리스마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400797t.jpg)
![[포토]즐거운 눈썰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400779t.jpg)
![[포토]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 '인사말하는 이재연 원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400633t.jpg)
![[포토]국민의힘 의원총회, '모두발언하는 권성동 원내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400506t.jpg)
![[포토]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 준비기일 27일 예정대로 진행](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400433t.jpg)
![[포토]'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400387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