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2010년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1~2인 가구(835만 가구) 중 60대 이상 노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37%에 이른다. 20~30대 1~2인 가구(29.7%)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특히 여성 1인 가구(222만 가구)는 60대 이상이 45.6%로 절반에 육박했다.
이들이 사는 지역도 대부분 농어촌에 밀집해 있다. 전남은 1~2인 가구 비율이 60%를 넘고, 경북에서는 58.2%에 이른다. 반면 서울(46.6%)과 인천(42.7%), 경기도(41.9%)는 평균치(48.2%)를 밑돌았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늘어나는 1~2인 가구 수요에 맞춰 주택 공급에 한창 열을 올리기 시작했다. 목표로 삼은 주택 공급 지역은 농어촌이 아닌 서울·수도권이었다. 주요 타깃도 노인층이 아닌 20~30대였다.
정부는 또 빠른 시일 안에 많이 지을 수 있는 주택을 택했다. 바로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 공급이 그것이다.
그 결과 현재 도시지역에서는 전세 수요가 많은 중형 주택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 전셋값 급등과 전세 품귀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반면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경우 과잉 공급에 수요자를 찾지 못해 민간 건설사들이 울상이다.
|
전문가들은 이 같은 초소형 중심의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 “주택 통계를 잘못 해석하고 정책을 편 대표적 사례”라고 꼬집었다. 정의철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고령화에 따른 60대 이상 농어촌 인구 증가가 1~2인 가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는데도 주택 공급 정책은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져 가구별 현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는 가구별 주거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2009년 이후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용 60㎡ 이하 소형 주택 공급을 꾸준히 늘려왔다. 2011년 초에는 ‘1·13 전월세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소형 주택 공급 확대를 서울·수도권 전세난의 해결책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 결과 2009년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량의 25.6%였던 소형 주택 물량은 지난해 48.4%로 증가했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지난 1~7월까지 수도권에서 준공된 주택은 총 8만7756가구로 이 가운데 52%(4만5463가구)가 전용 60㎡ 이하의 소형 주택으로 지어졌다. 초소형 주택으로 분류되는 전용 40㎡ 이하도 2만4986가구로 전체의 28%를 차지했다.
반면 신혼부부 등 2~3인 가구가 많이 찾는 60~85㎡ 중형 주택은 2만6122가구로 29%에 불과했다. 안정화를 기대했던 서울·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2009년부터 지난달까지 무려 35.6%(국민은행 자료) 올랐다.
|
정부의 소형 주택 공급 정책의 뿌리는 국토교통부가 정한 최소 주거기준에서 찾을 수 있다. 2011년 개정된 최소 주거면적은 △1인 14㎡ △2인 26㎡ △3인 36㎡ △4인 43㎡ △5인 46㎡ △6인 55㎡ 등으로 모두 60㎡ 이하 소형 주택에 포함된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가구 중 최소 주거면적 이하 주택에 사는 비율은 7.2%(128만 가구)로 2010년 10.6%(184만 가구)에 비해 56만 가구나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가구당 평균 주거면적은 68.6㎡에서 78.1㎡로 2년새 오히려 9.5㎡가 넓어졌다. 중형 주택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발표한 4·1 부동산 대책에서 향후 공공분양 물량은 전용 60㎡ 이하 소형 주택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형 주택 물량은 앞으로도 늘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간 건설사들도 정부 정책에 맞춰 소형주택 공급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안지아 한국부동산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최근 몇 년간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 주택에 집중됐던 주택 공급을 중형으로 분산했다면 현재의 전세난이 완화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곽창석 ERA코리아 부동산연구소장은 “중형 주택 거주 비율이 여전히 높은 만큼 소형 주택의 공급 쏠림을 막고 중형 물량과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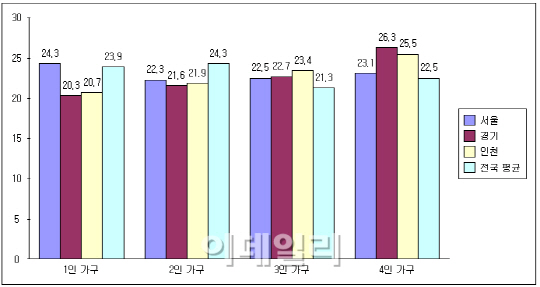






![[포토]김세은 아나운서,따스한 햇살 받으며](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1600281t.jpg)
![[포토] 평창고랭지 김장축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1501303t.jpg)
![[포토] 종로학원, 대입 합격점수 예측 설명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1501114t.jpg)
![[포토]이재명 민주당 대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1501110t.jpg)
![[포토]'구속VS무죄' 이재명 공판 앞두고 쪼개진 서초동](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1500881t.jpg)
![[포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자설명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1500752t.jpg)

![[포토]고생했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1401524t.jpg)
![[포토] 걷고 싶은 거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1401206t.jpg)
![[포토]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시민위원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1401169t.jpg)
![[포토]김세은 아나운서,진행은 매끄럽게](https://spn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1/PS24111600282h.jpg)
![[이車어때]"8800만원짜리 드림카"…벤츠 AMG A 45 S 4MATIC+](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1/PS24111600211h.jpg)


![예금자보호한도 24년만에 오른다고?[오늘의 머니 팁]](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1/PS24111600304h.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