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공공병원이 갈 길을 잃었다. 코로나19 후유증에 정부의 의료개혁 파장까지 더해져 지역거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관련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5년간 발표한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에 따르면 총 41곳의 지역거점공공병원 중 A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은 지난해 3곳, 올해 4곳으로 2022년(총 18곳) 대비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사진=이데일리 DB) |
|
지역거점공공병원은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기관으로 지방의료원법에 따라 설치됐다. 복지부는 이러한 지역거점공공병원이 지역 주민에 대해 얼마나 의료서비스를 잘 제공하는지부터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운영평가한다. 평가 결과 낮은 점수를 받은 병원은 운영개선계획을 수립, 제출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원장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A등급을 받은 지역거점공공병원은 △2018년 6곳 △2019년 12곳 △2020년 17곳 △2021년 15곳 △2022년 18곳 등으로 꾸준히 개선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2023년 3곳, 올해 4곳으로 뚝 떨어졌다. C등급 의료기관도 올해만 9곳을 기록하는 등 전년보다 1곳 늘었다.
지역거점공공병원이 전체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가장 큰 이유는 환자감소다. 지방의료원 특성상 고령층 환자가 많은데, 이 환자들이 동네 의원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특히 지방의료원 환자의 상당수를 차지했던 만성질환 환자가 급감했다. 2019년 한 해 51만 4056명의 고혈압 환자가 보건소와 공공병원 등 보건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지만, 지난해에는 27만 7830명으로 코로나19 전후 기준 약 45.9% 줄었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하자 지역의료원 36곳 등 66곳의 전국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해 대응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의료공백에 대비해 경증환자를 공공병원 등 지역의 2차병원으로 옮기고, 지역의료원은 야간·휴일 등에 연장 진료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환자들의 발걸음은 공공병원으로 향하고 있지 않다.
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 및 치료에 매진했던 병원들이 정상진료 시스템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아직 회복이 덜됐다”며 “여기에 코로나19 유행 기간에는 코로나19 치료 등의 기여도를 바탕으로 평가했는데 2023년부터 평가 시스템이 예전대로 바뀌어 착시 효과일 수 있다”고 설명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꺼냈지만, 현장 반응은 역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공공병원 한 관계자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의료진을 쓸어가 코로나19 기간 동안 의사와 간호사 급여가 많이 올랐다”며 “이로 인해 인건비 제한이 걸려 있는 공공병원은 사실상 인력 충원이 어렵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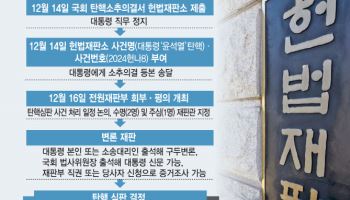








![[포토]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 특별전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1600846t.jpg)
![[포토]국민의힘 의원총회, '원내대표 발언듣는 의원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1600749t.jpg)
![[포토]'에어서울X정호영 셰프, 청소년들에게 우동 전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1600709t.jpg)
![[포토]의원총회, '대화하는 박찬대-박성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1600649t.jpg)
![[포토] 윤 대통령 지지 화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1600625t.jpg)
![[포토] 내란혐의 철저 수사 촉구 기자회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1600506t.jpg)
![[포토]당대표직 사퇴, '국회 떠나는 한동훈'](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1600473t.jpg)
![[포토]'내란 혐의 조사' 검·경·공 어디서…윤이 고르기 나름?](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1600419t.jpg)
![[포토] 서울시, 건설 분야 비상경제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1600372t.jpg)
![[포토]이동하는 문형배 헌법재판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1600241t.jpg)
![[포토]안소현-김성태 본부장,취약계증 후원금 전달식 진행](https://spn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2/PS24121400036h.jpg)


![[속보]윤석열 탄핵심판 주심 정형식 헌법재판관…보수 성향](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2/PS24121600899h.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