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농기계 업체가 자율주행을 넘어 무인 농업까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자율주행기술 탑재는 상용화 단계에 들어섰으며 완전 무인이 가능한 단계까지 개발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무인 농업이 가능해지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도 실시할 수 있는 ‘재택 농사’ 시대도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농사계획 수립을 기반으로 최대의 수확을 거두는 정밀농업까지 더해지면 ‘일은 덜 하고 생산성은 높아지는’ 결과까지 기대하고 있다.
|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동(000490)과 TYM(002900) 등 국내 주요 농기계 업체들은 자율 주행을 넘어 작업자의 운전·제어가 없어도 농경지 환경에 맞춰 수행하는 자율 작업 기능을 상용화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여기에 더해 사람의 개입 없이도 농업을 할 수 있는 무인 작업 단계까지 기술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농기계 자율주행은 통상 ‘원격제어→자동조향→자율주행→자율작업→무인작업’ 등 5단계로 나눈다.
선두주자는 ‘농슬라’로 불리는 대동이다. 이 회사는 직진·선회·작업 제어가 가능한 자율주행 3단계 콤바인 ‘DH6135-A’와 최초 1회만 작업 코스를 저장하면 이후에는 별도의 설정 없이도 경작지만 선택해 작업할 수 있는 트랙터 ‘HX1400-A’, 직진 자율주행기술로 1인 이앙이 가능한 이앙기 ‘DRP시리즈’ 등 다양한 제품군을 갖췄다.
자율주행 콤바인은 24시간 무중단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또 초정밀 위치 정보를 콤바인에 제공해 정지 상태에서 위치 정밀도는 2㎝ 이내, 작업 경로 추종 시 최대 오차 7㎝ 이내로 정밀하게 작업을 수행한다. 자율주행 트랙터는 최초 1회 경작지를 한 바퀴 돌아 4개의 외곽 포인트를 정하고, 시작 위치 및 회전 방법을 선택하면 자율작업 코스가 자동 생성돼 작업할 수 있다.
대동은 2025년까지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영상을 자동 인식 기반의 자율 작업 단계를 넘어 2026년부터는 한 사람이 여러 대의 트랙터를 관리하면서 획기적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군집 운영도 계획 중이다. 2030년부터는 실질적으로 논에서 인간의 개입 없이도 작업할 수 있는 진정한 무인 자율작업을 실행한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TYM은 지난 5월 트랙터 ‘T130’과 이앙기 ‘RGO-690’에 대해서도 자율주행 시스템 국가 검정을 동시에 통과했다. 오는 2026년까지 완전 무인 자율 농작업이 가능한 단계까지 기술 개발까지는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비용 저렴한 자율주행 키트도 주목
무조건 높은 단계의 자율주행 농기계를 사용하는 게 좋은 것은 아니다. 작업지의 규모·형태를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농기계는 고가 제품이다보니 농민들의 부담도 커서다.
이에따라 최근 자율주행키트가 주목을 받고 있다. 정밀농업 벤처기업 ‘긴트’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농기계를 제어할 수 있는 ‘플루바 오토’를 운영하고 있다. 농지별 경로 생성 및 주행 기능을 비롯해 △메모리 주행 △설정구간(AB) 직진 및 커브 등 첨단 자율 기능을 탑재했다.
있지만 플루바 오토는 1000만원 이하의 비교적 부담 없는 가격대에 접근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기존 농기계에 부착하는 형태라 개발단계부터 자율주행을 위해 개발한 농기계와 직접 비교는 어렵다. 하지만 논밭 손실률을 줄이면 3년간 평균 2000만원의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인력으로 작업이 가능해 3년간 인건비도 2000만원 이상 절감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입장이다.
자율주행 농기계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시도는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을 넘어 노쇠화하는 농업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자율주행을 하면서 쌓은 데이터를 정밀농업과 연계하는 것이 필수인 이유다. 정밀농업이란 농업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경운(흙갈이)·정지(땅 고르기)·이앙(모심기)·시비(비료살포)·방제(농약살포)·수확으로 이어지는 벼 생육 전주기에 걸쳐 최소 자원을 투입해 최대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토질 성분 분석에 기반해 필요 비료의 종류와 살포양에 대한 맞춤 처방, 모를 심은 후 월 1회 생육 사진 촬영 및 상태 분석으로 생육 상황에 맞는 최적의 추가 비료 살포 처방을 제공하는 식이다. 비료양은 줄이고 수확량은 늘릴 수 있다. 이런 데이터를 축적할수록 농업을 더욱 고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 전망이다.
이렇게 쌓은 경쟁력은 국내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이를 기반으로 급격히 성장하는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사막을 제외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러 지형이 공존하고 있는 만큼 국내서 다양한 상황에 맞는 스마트 농기계를 개발한다면 해외 현지화를 하는 데에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국내를 테스트베드 삼아 기술력을 닦은 뒤 북미, 동남아 등 해외에 진출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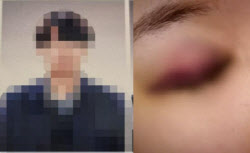



![[포토]고생했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1401524t.jpg)
![[포토] 걷고 싶은 거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1401206t.jpg)
![[포토]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시민위원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1401169t.jpg)
![[포토]1400원 뚫은 원-달러 환율…외환당국 '적극개입' 시그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1401121t.jpg)
![[포토]송길영 작가 "지상파를 역전한 넷플릭스" 기조강연](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1401082t.jpg)
![[포토]외규장각 의궤 전용 전시실 일반에 공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1401057t.jpg)
![[포토]발언하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1400713t.jpg)
![[포토] 2025학년도 수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1400625t.jpg)
![[포토]벼랑 끝에 있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1301728t.jpg)
![[포토]유상임 과기정토부 장관, 통신사 CEO 간담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1301573t.jpg)




